티스토리 뷰
엄마는 지난겨울 눈길에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하셨다.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는데 잘 견디셨다. 담당의사도 놀랄 정도였다. 가족들, 친척들, 동네 분들의 병문안이 이어졌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누구는 몇 번 오고, 무엇을 사오고, 얼마를 주고 갔다고 사람들의 면면을 이야기하느라 바쁘셨다.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온다고 서운해 하기도 하고, 그 집 어멈 죽었을 때 부조를 얼마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의 반만 주고 갔다고도 하셨다.
엄마는 죽만 드셔야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배곯아서 죽겄다. 곰국에다 밥 좀 말아 묵으먼 원이 없겄다.” 하셨지만 갈수록 미음을 넘기기도 힘들었다. 오빠는 “이렇게 안 드시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 요양병원 가셔야 하는데 거기 가실래요?” 하면서 한 숟갈이라도 더 드시게 반협박을 하였다. 엄마는 섬에 있는 보건소는 병원으로 치지도 않고 육지에 있는 큰 병원만 고집하셨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픈 노인들이 육지로 나가면 돌아오지 않고 요양병원이란 곳으로 갔다고 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요양병원은 옛날 양로원이었다. 그때부터 엄마는 보건소 단골손님이 되셨다.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것’에서 어려운 공부 많이 한 ‘의사선생님’으로 보건소 주치의 호칭도 바뀌었다.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쇠진해지고 정신까지 혼미해지셨다. 간병인을 그만두게 하고 시간을 낼 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모여 엄마 곁에 있기로 했다. 병원 가까이 사는 오빠 집에 짐을 풀었다. 오빠 집 거실은 이불이 산더미를 이루었고 올케는 밥을 해대느라 분주했다. 다른 올케는 점심밥을 싸서 날랐다. 그것도 여의치 않은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밥을 샀다. 자식들은 이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 버린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평생 엄마 모시고 산 시골 오빠는 엄마가 다시 일어나 이 년만 더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병원 옆에 사는 오빠는 엄마와 집에서 식사 한 끼 했으면 하고, 교장 선생이 된 막내 오빠는 학교에 모시고 가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간호사는 엄마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손자들까지 다 봤는데….’ 아, 큰오빠. 돌아가신 큰오빠 생각이 났다. 엄마에게 숨겨온 사실이다.
“엄마, 2년 전 엄마 구순 잔치 못 했잖아. 그때 큰오빠 돌아가셨어. 엄마 생신 일주일 전에. 그동안 말씀 못 드리고 외국 갔다고 거짓말했던 거 죄송해요. 큰오빠 아버지 옆에 있어요.”
엄마가 정신이 맑아지는 새벽에 말씀을 해 드렸다. 엄마는 짐작으로 긴가민가하였을 큰아들의 변고를 처음 들은 것이다.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서서히 편안해지셨다.
다음날 의사는 오늘이 고비라고 했다. 병실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하루 이틀이다 생각하고 보호자용 침대에 응접실까지 있는 특실로 모셨다. 일 치를 절차들을 의논하느라 갑자기 분주해졌다. 평소 나누어 드시는 걸 좋아하셨으니 음식은 푸짐하게 해야 한다. 남자들은 상복을 똑같이 빌려 입기로 하자. 도와줄 사람들은 손자들이 많으니까 문상객들을 보아가면서 부르자. 엄마가 들으니까 조용조용 해야 한다면서도 어느 순간 목소리들이 커져버렸다.
엄마는 우리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이제 알 것 다 알았으니 걱정 없다는 듯 하루하루 차도 없이 누워계셨다. 넓어진 병실에서 엄마에게는 주사기로 알량한 식사를 넣어 드리면서 우리들은 호박죽도 쑤어 오고, 피자도 시키고, 팥칼국수도 사와서 날마다 먹자판을 벌였다. 이렇게 재미있게 우리들이 놀고 있는데 엄마가 더 살고 싶으시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겠냐고 했다. 또 어렸을 적 이후로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지내보기는 처음이고 엄마 덕분에 끈끈한 우애를 다지고 있다고도 했다. 누워계신 분들은 주변이 조용한 것보다 가족들의 즐거운 소리가 들려야 더 안도감이 든다는 간호사의 말도 한몫 거들어 우리는 미리 밤달애를 하고 있었다.
특실로 모신 지 일주일이 지났다. 병원비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가 참고 있기라도 했다는 듯, 호스로 미음 드시면서도 몇 년을 사는 분들도 있다더라, 평소에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 힘들게 가신다더라, 요즘은 병원에서 노인들 수명을 한없이 연장시키고 있다더라, 여기저기서 들은 여러 말들이 오갔다. 며칠만 더 지내보고 다시 1인실로 모시든지 요양병원을 알아보든지 하자고 했다.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는 마지막 길을 힘겹게 넘고 계셨는데 우리는 잠 설쳤다고 찜질방 가서 쉬기도 하고, 뒷산으로 산책을 갔다 오기도 하고, 자기 볼일을 보러 다니기도 하면서, 그 따위 불경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들을 오래 비웠으니 교대로 집에 갔다 오자고 했다. 나도 마침 남편 생일도 있고 아들도 개학하는 날이어서 밤에 올라왔다. 임종 자식은 따로 있다더니 다음날 아침 엄마는 홀연히 가셨다. 남편과 자식들 핑계로 하루를 못 참고 올라왔을까 싶기도 하고, 엄마 곁에서 보름간 밤을 지새웠는데 막내딸 배웅은 받고 싶지 않으셨나 싶기도 했다. 엄마는 여러 날 말씀을 못하셨는데 그날 아침에는 또렷한 목소리로 아들 며느리 다 둘러보시면서 “느그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하셨단다. 팔 남매 기르느라 허리가 휘셨으면서도 무엇이 그리 미안하셨을까.
문상객들은 호상이라고 하였다. 구십 평생 큰 병치레 하지 않고 마지막 50일간 병원에 계시면서 자손들 친척들 다 보셨으니 호상일까. 하지만 당신의 큰 기둥이었던 큰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병원차에 실려 나온 뒤 가고 싶은 집에 다시 가 보지도 못하였는데… 잠자듯이 남의 손 안 빌리고 가고 싶다던 평소의 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정이 지나자 문상객도 뜸해졌다. 오빠들이 빈소를 지키기로 하고 남은 가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누웠다. 눈을 붙여야 한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엄마 가신 지 50여 일 만에 산소에 왔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 올케들 목이 반짝반짝 빛난다. 둘째 올케가 그동안 고생한 동서들에게 선사한 것이다. 시누이들은 이해를 할 것 같아 동서들 것만 준비했단다. “무겁지 않아요? 한 번 풀어 봐요.” 했더니 올케가 안 한 것처럼 편하다고 넌덕을 부렸다. 다른 올케들도 목걸이를 만지면서 환하게 웃는다.
* 밤달애 : 전남 신안 섬 지방 상가에서 상주를 위로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노는 축제식 장례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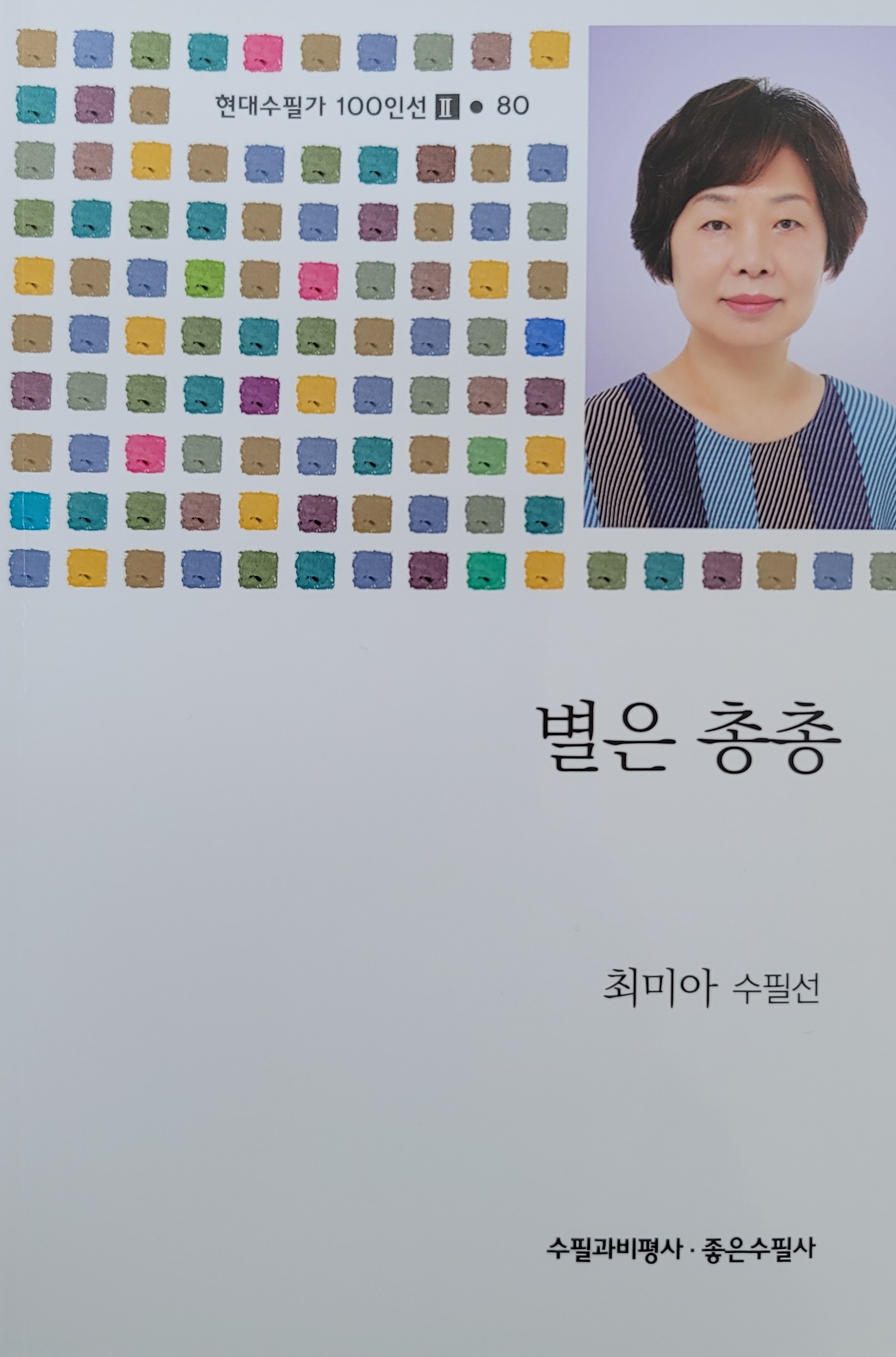
'수필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을 갈다 / 김이랑 (0) | 2020.12.07 |
|---|---|
| 뿌리의 은유 / 정태헌 (0) | 2020.12.04 |
| 오늘의 운세 / 최미아 (0) | 2020.12.03 |
| 제목들의 향연 / 최미아 (0) | 2020.12.02 |
| 수주 아내의 항변 / 최미아 (0) | 2020.12.02 |
- Total
- Today
- Yesterday
